정보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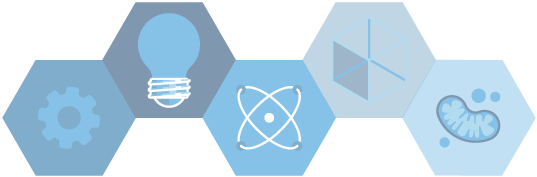
학문적 논의
교육학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1980년대 전후로 사회과학의 성격과 학문의 자주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교육학도 그 학문적 성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교육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논쟁'입니다.
교육학의 패러다임 논쟁
이 논쟁에서 네 명의 학자들은 교육학의 패러다임을 각각 다른 대립적인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는 교육학'과 '보는 교육학', '교직(실천) 패러다임'과 '신교육학 패러다임', '기술공학적 패러다임'과 '교육과학 패러다임', '교육실천학'과 '교육과학'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개념은 기존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두 번째 개념은 앞으로 지향할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교육학의 주류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꼽혔던 '교직 패러다임'이나 '교육실천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교육학이 여전히 교사 양성과 학교 교육 활동을 돕기 위한 실무 지식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황과 문제점
이러한 상황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학이 '교육과학' 패러다임을 지향할 필요가 있지만, '교육실천학'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직 패러다임' 또는 '교육실천학'이 실제로 어떤 양상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교육학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교직 패러다임'이나 '교육실천학'이라는 말 속에는 기존 교육학이 교육 현상에 대한 이론보다는 학교 교육의 실무에만 몰두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이 정당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육학이 이론보다 실천에 치우쳐 있다는 진단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교직 패러다임의 실태
교직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교육학의 목표나 기능이 주로 교사 양성이나 교직 실무에 치우쳐 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교육학이 논리의 세계에 머물지 못하고 실제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진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교육학자들이 교사 양성이나 교직 실무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고, 그들의 연구 활동이나 결과에서 한국의 교육 현실에 깊이 천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직과목 교재의 내용은 대부분 한국 교육의 실제와 거리가 멉니다.
교육학자들의 역할과 한계
물론 일부 교육학자들은 현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교육학자는 교육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려는 의지가 없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육학자들의 존재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일부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이 바쁜 이유는 대부분 한국 교육의 실제 문제와 씨름하기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씨름하는 실제 문제는 진정한 실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한국 교육의 실제'가 아니라 지엽적인 사안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실제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꿰뚫어 보는 시각은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첫째, 한국 교육학의 태동과 성장이 한국의 교육 실제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과 충원 과정에서 교육 현실과의 관련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실과의 괴리
결과적으로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교수들이 예비 교사들을 가르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사 양성기관에서는 현장 경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양성기관에서 배운 내용 중 교직 수행에 실제 도움이 된 것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실은 교육학과 교육 현장의 거리감을 보여줍니다. 교육학자가 실제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장 가까이에서 실천가들과 교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학 교수들이 초중고 교육 현장을 잘 방문하지 않으며,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학자로서 살아가는 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학은 교육 현장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육학은 이러한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과의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자들이 교육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실제 교육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